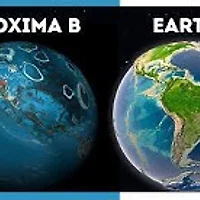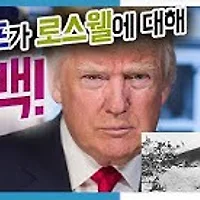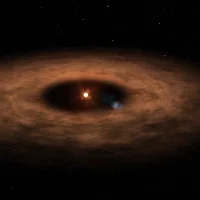[달콤한 사이언스]
태양계 가장 가까운 곳에 슈퍼지구 있다
입력 : 2020-06-26
11광년 떨어진 적색왜성 글리제887 주변 도는 슈퍼지구 2개 발견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슈퍼지구 2개 발견 지구에서 11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적색왜성 ‘글리제 887’(가운데 붉은색) 주변을 돌고 있는 슈퍼지구 2개가 발견됐다. 표면온도도 70도 정도에 불과하고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하며 공기층도 두껍게 형성돼 있는 등 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돼 생명체 존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 괴팅겐대/사이언스 제공

▲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슈퍼지구 2개 발견
지구에서 11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적색왜성 ‘글리제 887’(가운데 붉은색) 주변을 돌고 있는 슈퍼지구 2개가 발견됐다.
표면온도도 70도 정도에 불과하고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하며 공기층도 두껍게 형성돼 있는 등 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돼 생명체 존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 괴팅겐대/사이언스 제공
액체상태의 물과 대기층도 두꺼워 생명체 존재 가능성 높아
7개국 19개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천체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지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슈퍼지구를 발견했다. 생명체 존재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예측돼 주목받고 있다.
독일 괴팅겐대, 영국 런던 퀸스메리대, 스페인 안달루시아 천체물리학연구소,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대(UCSC), 카네기 과학연구소, 칠레 산티아고 국립대, 스위스 베른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11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왜성 ‘글리제 887’주변을 돌고 있는 슈퍼지구(Super-Earth) 2개를 발견했다고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 26일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유럽남방천문대(ESO)에서 운용하고 있는 칠레 라실라 관측소 천체망원경에 장착된 ‘초정밀 시선속도 행성추적기’(HARPS)를 이용해 글리제 887을 관측했다.
별(항성)이 지구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별의 이동속도를 측정한다. 그런데 항성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는 경우 별은 행성의 공전주기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는데 이 미세한 변동을 측정하는 장치가 HARPS이다.
슈퍼지구 찾아낸 유럽남방천문대의 3.6m 천체망원경 7개국 19개 연구기관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유럽남방천문대(ESO)에서 운용하는 칠레 라실라 관측소 천체망원경에 장착된 HARPS라는 장치로 슈퍼지구 2개를 찾아냈다. 위키피디아 제공

▲ 슈퍼지구 찾아낸 유럽남방천문대의 3.6m 천체망원경
7개국 19개 연구기관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유럽남방천문대(ESO)에서 운용하는 칠레
라실라 관측소 천체망원경에 장착된 HARPS라는 장치로 슈퍼지구 2개를 찾아냈다. 위키피디아 제공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글리제 887는 태양보다 크기와 밝기는 절반에 불과한 적색왜성이다. 연구팀의 관측결과 글리제 887을 공전하는 2개의 슈퍼지구를 발견된 것이다.
글리제 887b와 글리제 887c로 이름붙여진 이들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약간 큰 편이지만 공전속도가 각각 9.3일과 21.8일로 수성보다 빠르게 별 주위를 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보다 약간 큰 편이지만 지구와 똑같은 바위형 행성으로 중력이 강해 대기가 안정적이고 지각운동도 활발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슈퍼지구는 적색왜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글리제 887c의 행성표면 온도는 섭씨 70도 정도로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확인돼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지금까지 관측된 지구형태의 외계행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
더군다나 적색왜성인 글리제 887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강한 플레어가 발생하지 않아 행성의 대기를 쓸어버릴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산드라 예퍼스 괴팅겐대 천체물리학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슈퍼지구들은 태양계 바깥 외계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큰 행성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슈퍼지구 한 개 정도를 더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 슈퍼지구는 허블우주망원경을 대체하게 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집중적으로 관찰하게 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25500147&wlog_tag3=daum
130억년 전 초기 우주서 태양질량 15억배 '괴물' 퀘이사 관측
송고시간2020-06-26
엄남석 기자
초대형 블랙홀 형성하기엔 이른 시점…블랙홀 형성·성장 이론 '흔들'

퀘이사 포뉴아에나 상상도
[International Gemini Observatory/NOIRLab/NSF/AURA/P. Marenfeld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 빅뱅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우주에서 태양의 질량의 15억배에 달하는 '괴물' 블랙홀을 가진 퀘이사가 관측돼 학계에 보고됐다.
'J1007+2115'라는 공식 명칭이 부여된 이 퀘이사의 빛은 약 130억2천만년 전 것으로 퀘이사 중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됐지만 블랙홀의 질량으로만 따지면 초기 우주에서 가장 큰 퀘이사로 기록됐다.
퀘이사는 태양 질량 수십만에서 수백억 배에 이르는 초대질량블랙홀이 주변을 도는 강착원반의 물질을 빨아들이는 활동은하핵(AGN)을 가진, 매우 멀리 있지만 별처럼 밝은 빛을 내는 은하를 지칭한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천체 중 하나로 138억년의 우주 역사에서 언제 처음 출현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미국 애리조나대학과 미국 국립과학재단 국립광학·적외선천문학연구실(NOIRLab)에 따르면 이 대학 스튜워드천문대의 양진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빅뱅 뒤 약 7억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시작된 퀘이사의 빛을 관측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 회보'(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발표한다.

마우나케아산 정상의 제미니천문대
[ International Gemini Observatory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팀은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있는 제미니 천문대와 W.M.켁 천문대 망원경을 통해 이 퀘이사의 존재를 확인했다. 하와이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마우나케아산의 망원경으로 발견된 점을 기려 하와이어로 "빛으로 둘러싸여 회전하는 보이지 않는 창조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진 '포뉴아에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양 박사는 "포뉴아에나는 태양 질량 10억배 이상 블랙홀을 가진 천체 중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이라면서 "작은 블랙홀이 이처럼 큰 규모로 커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했다.
연구팀은 포뉴아에나의 존재가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기존 이론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일 별이 붕괴해 만들어지는 작은 블랙홀이 빅뱅 뒤 7억년밖에 안 된 시점에 포뉴아에나와 같은 초대형 블랙홀로 성장하는 것은 현재 이론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빅뱅 1억년 이내에 블랙홀 씨앗으로 포뉴아에나가 형성되는 상상도
왼쪽은 빅뱅 1억년, 오른쪽은 7억년 뒤 태양 질량 15억배의 퀘이사로 형성된 것을 묘사했다.
[International Gemini Observatory/NOIRLab/NSF/AURA/P. Marenfeld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팀은 포뉴아에나와 같은 퀘이사가 존재하려면 빅뱅 뒤 1억년 이내에 태양의 1만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 "씨앗"(seed)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이론으로는 빅뱅 뒤 우주는 빛조차 없는 암흑기가 이어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약 4억년쯤 뒤 수소의 이온화가 이뤄진 '재이온화기'(Epoch of Reionization)로 제시돼 있다.
이 재이온화기는 수억 년간 진행되는데, 포뉴아에나는 재이온화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포착된 천체여서 재이온화기 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지난 2018년에 관측된 퀘이사 'J1342+0928'이 포뉴아에나보다 약 200만년 더 앞선 것이기는 하나 우주 단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퀘이사의 질량은 포뉴아에나의 절반밖에 안 된다.
논문 공동저자로 두 퀘이사의 관측에 모두 참여한 UA 천문학과의 판샤오후이 교수는 "130억년 중에서 200만년의 차이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eomns@yna.co.kr>2020/06/26 16:47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6133400009?section=international/all
'지구촌 얘기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흔적 없이 사라진 별 먼지 속에 숨었나 블랙홀 됐나 (0) | 2020.06.30 |
|---|---|
| + 생명체 있을까?…해왕성의 미스터리 얼음 위성 트리톤의 비밀 (0) | 2020.06.30 |
| + '초신성 폭발 임박설' 베텔게우스 광도 급감은 항성흑점 영향 (0) | 2020.06.29 |
| +【속보】NASA가 외계인 탐사를 마침내 본격 시동!? (0) | 2020.06.29 |
| + 트럼프 고백! - 대통령 선거전에 UFO 외계인 정보 공개? (1) | 2020.06.28 |
| + '현미경자리 AU'서 10여년 관측 끝에 해왕성급 행성 찾아내 (0) | 2020.06.26 |
| + UFO 뉴스 [6/25 ~ 6//21/2020] / 태양 주변에, 지구촌 상공에 여기저기 출현하고 있는 UFO 동영상 모음 (0) | 2020.06.26 |
| + 목성 위성 유로파 얼음층 밑 대양 '생명체가 꽤 서식할만한 곳' (0) | 2020.06.25 |
| + ‘지구를 지켜라’…소행성 디모포스에 우주선 충돌시키는 이유 (0) | 2020.06.24 |
| + [아하! 우주] 먼지 휘날리는 외계행성에도 생명체 존재 가능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