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셉션 현실화?…인위적으로 ‘자각몽’ 실험 성공
입력: 2014.05.12 15:39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 그의 생각을 빼낸다는 기상천외한 스토리의 영화 ‘인셉션’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최근 독일 JW 괴테대학 연구팀이 뇌에 전류를 보내 자각몽을 꾸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자각몽(自覺夢·lucid dreaming)이란 수면자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현상으로 경우에 따라 자유의지로 하늘을 나는 등 스스로 꿈의 통제도 가능하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과거 한번도 자각몽을 꾼 적 없는 27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얻어졌다. 연구팀은 잠들어 있는 동안 눈꺼풀 밑에서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인 REM수면에 주목해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연구팀은 피실험자가 REM수면에 들어간 3분 후 뇌의 정면과 측두부 쪽에 40헤르츠 정도의 미세 전류를 흘렸다. 뇌의 이 부분은 숙면과 관련된 감마파가 생성되는 지역으로 자각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한번도 자각몽을 꾼 적 없는 일부 피실험자들이 자각몽을 꿨으며 스토리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연구를 이끈 우루술라 박사는 “이번 결과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의식적으로 과거를 기억해내거나 미래를 보는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번 연구가 큰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 악몽을 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신경과학’ (Nature Neuroscience) 최신호에 발표됐다.
나우뉴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12601018
“IQ 올려주는 유전자 발견…치매완치 가능성↑”
입력: 2014.05.12 0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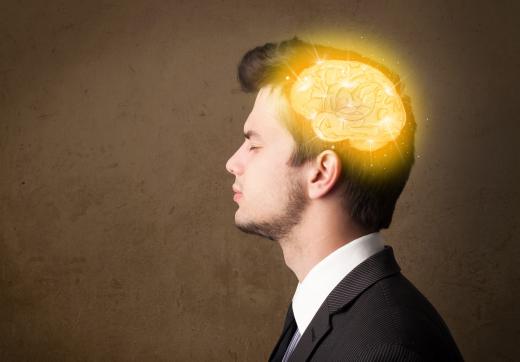
지능지수를 향상시켜 주면서 기억력 감퇴, 사고력 저하 등 치매질환으로부터 뇌를 보호해주는 유전자가 발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측은 해당 대학 신경센터와 비영리 독립연구기관 그래드스톤 연구소(Gladstone Institutes) 공동 연구진이 기억력 상승, 사고력 증진 등 지능지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유전자 생산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특정 유전자는 사람의 ‘KL 유전자’에 의해 생성되는 효소인 ‘클로토(Klotho) 유전자’로 지난 1997년 처음 존재를 드러냈다. 해당 유전자는 인삼사포닌 분해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코시다제’와 ‘I형 막 단백질’ 생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해당 유전자를 지닌 52세 이상 85세 미만 연령층을 대상으로 3년여에 걸쳐 700여 가지가 넘는 표본 추적 조사를 실시했고 통계적으로 주목되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 치매를 앓을 확률이 현저히 적었고 학습능력, 기억력 , 주의력 등의 인지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이 클로토 유전자는 주로 신장, 소장, 전립선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뇌 해마와 전두피질 세포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최대 6포인트가 넘게 지능지수를 향상시킨다. 실제로 클로토 단백질이 과잉 생산된 실험용 쥐의 경우, 학습능력과 기억력이 놀랍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신경퇴화학과 디나 듀발 교수는 “해당 유전자는 두뇌의 학습 용량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뇌 능력을 감퇴시키는 치매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환자를 치료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지원으로 진행 중인 의학 프로젝트 중 하나다.
자료사진=포토리아
나우뉴스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12601001&spage=2
'세상속 얘기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디아트 통신 :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부터 ~ 세월호 문제까지 등 등... (0) | 2014.05.15 |
|---|---|
| + 외계인이 남긴 발자국? 미스터리 원형 / 고래·상어 공동묘지 (0) | 2014.05.15 |
| + 폴란드서 실제 중세 뱀파이어 흡혈귀 유골 발견? (0) | 2014.05.14 |
| + 실제 ‘웜홀’ 열렸다? 정체불명 구름현상 포착 / 하늘에서 ‘물고기 비’ 내려 (0) | 2014.05.13 |
| + 무서운 바이러스 - 無백신· 치사율30% ‘메르스’ 美 잇단 감염 초비상 (0) | 2014.05.13 |
| + 남극얼음 속 新활화산 발견…지구온난화 위험↑ (0) | 2014.05.12 |
| + 고속질주 자동차 타격하는 ‘죽음의 암살자’ 가공할 위력 드론 (0) | 2014.05.11 |
| + “아기시절 기억 못하는 이유, ‘새 뇌세포’ 때문” <연구> ? (0) | 2014.05.10 |
| + 20살 미인대회 우승女, 테러모의 혐의로 체포 (0) | 2014.05.10 |
| + 세월호 선장, 팬티 바람 탈출한 진짜 이유가… 美 50개주 동시시위 (0) | 2014.05.09 |